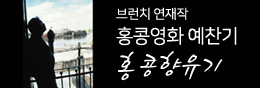옥수수밭 - 1
이혜정
얇은 구두 굽 사이로 질척질척 비에 젖은 흙들이 들러붙었다. 발자국 소리는 내리는 빗소리와 박자를 맞추지 못한 채 철저히 분리되어 나갔고, 나는 되려 내 걸음 소리에 스산해져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았다.
5년만의 귀국이었지만 그 어떤 감흥도 없었다. 터미널에서 또 다시 허름한 버스로 갈아 타고 구불 구불 한참을 들어오며 나는 생각했다. 4박 5일의 출장 일정이 이틀만에 끝나고 우연히 시간이 비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이곳에 들르지 않았으리라. 덜컹대는 성근 포장길과 금방이라도 멈출 듯한 묵은 버스를 원망하며 짧은 한숨을 뱉었다. 여고시절, 나는 이 버스 뒷 좌석에 앉아 얼마나 들이킬 수 없는 꿈들에 목 말라했던가.
진서미 사진관니은 받침이 떨어져나간 낡은 간판에 세월은 어렴풋이 먼지를 이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류장 옆 사진관 김씨네 둘째 미영 언니가 팔십 팔년도인가 미인대회 예선에서 입상을 한 그 해 김씨네 사진관에는 새로 간판이 걸렸다. 언니가 본선에서 어느 화장품 회사의 이름을 딴 상을 받고 처음 시골로 내려오던 날, 나는 지금처럼 이 정류장에 선 채 물끄러미 진선미 사진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얀색 플레어스커트와 컬이 굵은 파마머리 그리고 돌아서던 언니에게서 풍기던 향수 냄새는 도시의 삶을 동경하던 내게 낯선 곳을 향한 치명적인 자극제 같았다. 수 없이 다려 반들반들해진 팥죽색 교복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오랜만에 마주친 미영 언니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그 때 처음 이곳을 떠나리라 마음먹었으리라.
'영정 사진 찍습니다.' 기억을 싹둑 잘라버리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온다. 수년 전 미영 언니의 수상 사진이 놓여있던 자리 위로 영정 사진을 찍는다는 아무렇게나 꾹꾹 눌러쓴 종이가 붙어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고 더 이상 사진관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곳이 이렇게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다른 것은 모두 같았다. 방앗간 집은 여전히 한 귀퉁이에서 먼지가 소복이 쌓인 쌀 과자 따위를 팔고 있었고 천장에 매단 파리 끈끈이만이 앙상한 뼈처럼 빙빙 돌아가고 있었다. 길 끝에 자리한 미용실집 유리창에 붙어 있는 금발 모델의 색 바랜 포스터. 유행 지난 머리를 자랑하는 포스터는 이제는 사라진 염색약 회사에서 오래 전 홍보용으로 주고 간 것이리라. 이곳은 어째 이리 철지난 것들뿐일까.
어느새 어둠은 성큼 성큼 내려와 나의 머리 위로 잡아먹을 듯 꽈리를 틀었다. 검푸른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학도의용병들을 집합시켜 놓은 마냥 집 앞으로 들어가는 늦여름의 밤길은 온통 젖은 옥수수나무들로 가득 차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오랜 기간 뇌리에서 잊혀진 줄 알았던 무언가의 숨소리가 귓가에서 서걱서걱 바람에 날렸다. 나는, 유난히도 밤에 걷는 이 옥수수 밭길을 무서워했었다.
"으아아악!!!"내가 저 건네로, 건너 마을을 항상 저 건네라고 부르던 탓에 저 건네는 건너 마을을 가르키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심부름을 다녀올 때마다 오빠는 옥수수 밭이 시작되는 길에 몰래 숨어 어린 나를 기다렸다. 훌쩍 자란 옥수수나무 뒤에서 불쑥 튀어나와 나를 놀래키면 나는 매번 자지러지듯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제야 오빠는 히죽대며 다가와 내 옷에 뭍은 흙을 툭툭 털어주고는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우리 은진이는 옥시기는 잘만 먹으면서, 옥시기 서있는 길은 뭘 그리 무서워 할까나?"
"옥수수 나무들은 밤에 보면 사람같이 서 있단 말야. 키도 이렇게 크고 나무들이 집을 다 가려서 여기선 집도 안보이잖아. 오빠가 엄마보고 옥수수 그만 심으라고 하면 안돼? 그러면 오빠도 여기서 나 안 기다려도 되잖아. 응?"
내 철없는 투정에 오빠가 어린 나의 손목을 잡고 여름밤을 달리면 나는 입을 삐죽 내밀며, "치, 들은 체도 안하네. 촌스럽게 엄마랑 오빠는 왜 맨날 옥시기라 해? 선생님이 옥시기는 사투리라고 옥수수라고 하라 그랬단 말이야!"하고 볼멘소리를 했다.
빌린 밭에 심는 옥수수가 엄마의 설움으로 자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오빠는 혼자 남아 농사를 지었다. 밭농사가 유난히 흉작이라 엄마가 힘들어 하던 어느 해, 종로 어딘가에 있는 국제결혼 소개소에 다녀온 오빠는 홀연히 베트남에 가서 식을 올리고 왔다. 내 새언니가 될 나보단 어린 타지의 아낙은 고향을 등지고 두 달 후 오빠가 있는 이곳으로 왔고, 군청에서 주최한 조촐한 단체 결혼식에서 그들이 부부의 연을 맺던 날 나는 웃지도 않은 채 가족사진을 찍었다. 수많은 농촌 신랑들 사이에서 오빠는 결혼식 날마저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았고, 나는 못내 가슴이 에려 종일 대상없는 누군가를 원망했었다.
/ 다음 호에 계속....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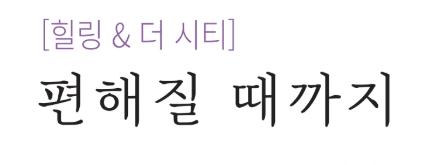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테니스협회]- 2025년 한인회장배테니스대회
홍콩한인회가 주최하고 홍콩한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홍콩한인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2025년 5월 1일(목) 주경기장은 Kowloon Tsai Park Tennis Courts, 금배부는 Coastal Skyline Clubhouse, Tung Chung에서 열렸다.대회경기결과금배부우승: 양근모 / 오영일 준우승: 김대준/ Xavier Bellier공동 3위:윤성민/김수성오승훈/Aron Yuen은배부우승: 심상훈 / 오승...
[홍콩한인테니스협회]- 2025년 한인회장배테니스대회
홍콩한인회가 주최하고 홍콩한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홍콩한인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2025년 5월 1일(목) 주경기장은 Kowloon Tsai Park Tennis Courts, 금배부는 Coastal Skyline Clubhouse, Tung Chung에서 열렸다.대회경기결과금배부우승: 양근모 / 오영일 준우승: 김대준/ Xavier Bellier공동 3위:윤성민/김수성오승훈/Aron Yuen은배부우승: 심상훈 / 오승...

 [홍콩한인체육회]-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 성료
[홍콩한인체육회]-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 성료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3일 (토)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3일 (토)
 서라벌 - 홍콩판 "흑백요리사"에 참여
서라벌 - 홍콩판 "흑백요리사"에 참여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