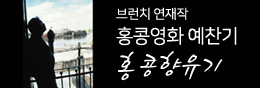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 [제119호, 3월24일]
들어가는 글
딸아이가 만다린 시간에 배워서 집에서 흥얼거리는 바로 그 멜로디, 어린..
[제119호, 3월24일]
 들어가는 글
들어가는 글
딸아이가 만다린 시간에 배워서 집에서 흥얼거리는 바로 그 멜로디, 어린 시절 우리 집 낡은 축음기로 듣던 영화 '스잔나'의 주인공 '리 칭'이 부르던 바로 그 노래. 나의 언니가 매일 따라 부르던 '사랑의 스잔나' 의 'One Summer Night' ... 청아한 여주인공 '진추하'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꽤나 희성이던 나의 성씨와 같은 '진'씨라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취권' 의 '성룡', 영화 '구룡의 눈' 에서 풋풋했던 '장만옥', '사랑해요 밀키스' 광고의 '주윤발', 그리고 가끔씩 신문에 실리던 '케세이 퍼시픽' 승무원 모집 광고...
12년 전 4월 26일, 아시아나 항공기에 실려 날아오던 내가 가진 '홍콩' 에 관한 지식 내지는 기억의 전부였다. 국제도시답게 그저 '살인 미소'의 '주윤발', 늘씬쭉쭉 '장만옥' 같은 사람들이 그득하리라 짐작했던 내게 실제로 다가온 이 곳 사람들은 약간의 ' 충격' 이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리처드 칼슨' 에게 어떤 이가 물어왔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자 칼슨은 그에게 "당신이 사는 곳의 사람들은 어때요?" 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죠." 라고 대답했다. 칼슨은 그에게, "만약에 당신이 캘리포니아에 온다면 캘리포니아 사람들 역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해주었다.
칼슨의 책에 나오는 이 대화에 담긴 충고의 의미를 나 역시 모르는 바 아니나, 이곳에서 '한 다스'( One Dozen)의 세월을 보내며, 꽉 채워져 잘 닫히지도 않는 내 마음의 서랍 속에 대책 없이 뒹굴고 있는 얼기설기 얽힌 두서없는 이 기억들을, 이젠 버선 뒤집듯이 확 뒤집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어떤 것은 햇볕에 바짝 말려 작은 여러 개의 상자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어쩌면, 이곳에서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을지도 모를 나의 맘속의 개운한 평화를 위해.
 앵무새 영어
앵무새 영어
지난 연말 내 딸의 또 하나의 방 식구가 된 'Furby'란 부엉이 장난감은 신기하게도 말을 알아듣고 할 줄 안다.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지만, 내 딸이 노래하라면 하고 얘기해 달라고 하면 얘기하고 자라면 '쩝쩝 음냐음냐' 하곤 그 큰 눈을 감고 잔다. 자신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그 부엉이가 마냥 흡족한지 딸애는 3개월이 지나도록 물리지 않고 잘도 갖고 논다.
처음 홍콩에 오면 이 곳 사람들의 유창한 영어에 놀란다. 그러나 이틀만 지나면 기본적인 단어도 못 알아듣는 이들이 많음에 새롭게 놀라고, 서울에서의 진한 화장이 이곳의 습한 날씨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연한 화장이나 맨 얼굴로 대체될 무렵이면 영어 잘 하는 듯 보였던 많은 이들도 극히 한정된 범위 내의 같은 문장만 앵무새처럼 조잘대고 있음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다.
얼마 전 Gym에 붙은 안내문을 읽고 의문점이 있어 담당직원에게 물었더니 나의 질문은 이해도 못한 채 벽보에 이미 나온 내용만 계속 되풀이 대답하는 게 아닌가. 눈이 있으니 글씨는 나도 읽을 줄 아는데 입 아프게 시간낭비하면서 뭐 하러 다시 묻겠는가. 자신이 못 알아들었으면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그저 각본에 있는 것만 테이프 되돌려 감듯이 반복하고 있으니 'Furby'가 따로 없다.
물론 영국 식민지 시절을 오랜 세월 지낸 나라답게 홍콩엔 자연스레 수준 있는 영어가 나오는 이들도 무척 많다. 소위 엘리트 집단인 정치인들에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광동어와 영어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냉탕 온탕 번갈아 드나들 듯' 가뿐하게 넘나드는 이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어느 동네 어느 심란하게 생긴 개인 병원에 들어가도 영어로의 의사소통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의사를 만날 수 있으니.... 처방전에는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전문용어를 유식한 척 갈겨쓰며 환자에겐 자세한 설명 해 주길 성가셔하는, 여전히 권위적인 우리나라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과연 여기가, 공중파 영어 방송이 2개나 있고, '차찬탱'의 메뉴판에서조차 영어메뉴를 찾아 볼 수 있는(물론 없는 곳도 잇지만) 국제 도시 맞아?" 반문할 정도로 '영어는 철저히 남의 일' 인 사람들도 많다. 택시를 타면 유명 호텔이나 큰 길 이름도 광동어로 얘기해야만 목적지까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 난 초행길엔 목적지를 한자로 쓴 종이와 발음, 성조까지 정확하게 익힌 후 택시를 타곤 한다.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동네야 좀 다르겠지만 맥도날드나 기타 레스토랑에 가서 세트 메뉴나 판에 박힌 주문 대신 아주 조금만 변화를 줘서 영어로 주문을 하면 종업원의 표정이 못 미더운 것이 영 찜찜하나 재차 확인 질문도 안 하니 그냥 두면 영락없이 다른 것이 나오거나 뭔가를 빠뜨리기 일쑤다. 'Furby'가 각본에 있는 질문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도 알아듣지 못 하고 딴소리를 반복해 대듯이.
급해서 택시 탄 사람 오히려 빙빙 돌게 만들고 남의 즐거운 식사의 흐름을 방해하고도 이런 경우 그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이 때로는 꽥꽥거리기까지 하니 '적반하장',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는 말의 설명으로 이만큼 적당한 경우가 그 어디 또 있을까.
(계속)
<글 : J.Y.JEEN>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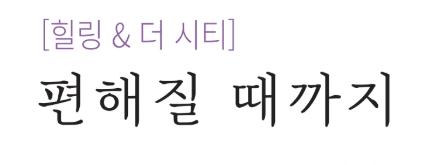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




 들어가는 글
들어가는 글 앵무새 영어
앵무새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