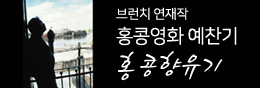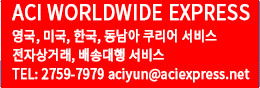- [제124호, 5월4일]
지난 달 24일로 이곳에 터를 잡은 지 12년이 되었다. 딱 부러진 광동어도 격식에 맞는 ..
[제124호, 5월4일]
지난 달 24일로 이곳에 터를 잡은 지 12년이 되었다. 딱 부러진 광동어도 격식에 맞는 영어도, 악착같이 배워야 한다는 의지를 박약하게 만드는 환경 덕에 영어도 중학생 때 배운 그 수준, 광동어도 맨날 같은 수준의 말만 계속해서 우려내고 있는 형편이나 위로를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 모두 들은 풍월[風月]은, 겨울 해질녘 야외에 벗어둔 외투가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는 이슬로 촉촉하게 젖듯이, 부지불식간에 차곡차곡 쌓여 말은 잘 못해도 듣기에 있어서는 많은 진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환경이 때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점[利點]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첫째는, 어눌하며 개미 쳇바퀴 돌 듯 하는 영어일지언정 사용할 기회는 영어 모국어자만 그득한 곳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내 아이들의 학교는 지역적인 특성상 동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일본사람을 제외하곤 학교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동양 엄마들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만 왠지 외모에서 느끼는 친근함 때문인지 쉽게 말을 트게 된다.
둘째는, 다양한 악센트의 영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체증[滯症]과 몸살로 병원에 갔었는데 홍콩인 의사의 영어를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도 그럴 것이 중·고교 시절 들은 영어는,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된 순 미국식 영어 아니면 선생님들의 5,60년대의 순 한국식 영어 발음이었으니. 이따금 병원에 갈 때면 나이 지긋한 홍콩의사의 따발총 같은 광동어 악센트의 영어를 거의 다 소화해내는 지금의 나를 발견하곤 12년 전의 난감함이 떠올라 새삼 웃음 짓게 된다. 그 밖에도 인도, 필리핀, 일본, 스코틀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소화는 아직 잘 못하지만 그들의 모국어 액센트와 어쩜 그렇게도 닮은 각색의 영어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 또한 행운이라 하겠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 엄마의 말에 의하면, 다양한 악센트의 영어를 접하는 것이 표준영어만 접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사실 이곳에 살면서 표준영어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구심도 들지만). 아이들이 이상한(?) 악센트와 발음을 배워 그대로 굳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단다. 어릴 때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커 가면서 자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를 구사하게 되니까. 물론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르나 내 아이들만 봐도 난 그 엄마의 말에 동의한다. 어차피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인데 "흥, 저 사람 영어는 영 요상해서 못 알아듣겠어!" 라고 불평만 한다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셋째는, 아이들을 '영어만 할 줄 아는 아이' 로 자라게 하는 환경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TV나 거리 곳곳에서 매일 들려오는 광동어를 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영어권’ 만이 아닌 언어 환경이 '국어나 중국어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고 난 믿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온통 영어만 들리는 지역보다 영어실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난 오히려 그런 융통성 있는 환경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가끔 "우리 애는 한국어를 너무 못 해요."라며 걱정하는 우리나라 엄마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가만히 안 보고 척 보기만 해도 기실[其實]은 "우리 애는 영어만 모국어 사용자같이 너무 잘 한답니다." 자랑하려는 맘이 역력하다.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이거나 영어 상용국[常用國]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살았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 바쁘다든지 납득이 갈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난 속으로 이렇게 되받곤 한다. '아, 당신의 아이는 한글도 영어도 둘 다 잘 못 하고 영 별로군요.'. 다른 곳도 아닌 홍콩 같은 배경에선 아이가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관심과 인내를 갖고 모국어를 익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영어나 기타 외국어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여기서 '잘함'이란 그냥 툭툭 던지는 짧은 일상용어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휘력이나 작문능력에 있어서도 모국어로 훈련이 잘 된 아이일수록 Second Language로 글을 읽고 쓰는 데에도 익숙하다. 두 언어 중 어느 쪽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며 잘 해내는가에 있어서는 개인 차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인터뷰
식민지 시절에 비하면 훨씬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들에겐 여전히 신경 쓰이는 일이다. 이 곳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라면 이미 2년 정도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누가 개인 레슨이라도 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시키자니 좀 그렇고 안 하자니 가끔 불안해진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정 기간 레슨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마시길. 그냥 아이에게 영어로 듣고 말하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인터뷰 장면 시에 편하게 응할 수 있게 하자는 정도의 기대면 충분. 고로 깐깐하거나 비싼 레슨비를 요구하는 선생님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편하게 한다면 이 단계에서 레슨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유치원이 3시간 반일제라 좀 성에 안 찬다면 인터뷰 앞둔 몇 달간 엄마가 아이에게 영어를 써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이고 내 틀린 영어와 발음 따라하면 어째' 하는 걱정은 하지 말고. 영어환경에 친근하도록 도와주자는 것이지 엄마가 조목조목 가르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 이 시기는 부모 입을 통해 모국어를 익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니 두 가지 언어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집 밖에서라면 "잘도 못 하면서 애한테 웬 영어? 티 내긴!.." 하는 우리나라 엄마의 따가운 시선도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해 긴 시간 학교에 머물게 된 후에는 엄마는 철저히 모국어로 돌아와 우리 말 들을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자녀에게 고운 우리말을 많이 써 주면 될 성 싶다.
(계속) 글 : J.Y. JEEN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법은역사적으로 영국의 교회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후 세속법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점차 보통법 (Common Law)의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법은역사적으로 영국의 교회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후 세속법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점차 보통법 (Common Law)의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홍콩한인여성회 "이금기 요리 강좌를 마치고"
홍콩한인여성회 "이금기 요리 강좌를 마치고"
 라이프정글협회 드래곤보트 팀 모집 안내
라이프정글협회 드래곤보트 팀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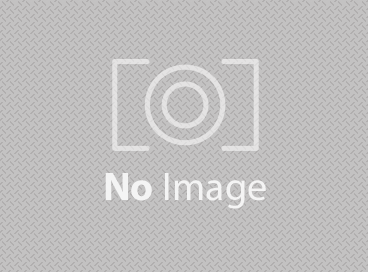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989호] 2024년 05월 10일
[989호] 2024년 05월 10일

 목록
목록




 첫째는, 어눌하며 개미 쳇바퀴 돌 듯 하는 영어일지언정 사용할 기회는 영어 모국어자만 그득한 곳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내 아이들의 학교는 지역적인 특성상 동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일본사람을 제외하곤 학교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동양 엄마들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만 왠지 외모에서 느끼는 친근함 때문인지 쉽게 말을 트게 된다.
첫째는, 어눌하며 개미 쳇바퀴 돌 듯 하는 영어일지언정 사용할 기회는 영어 모국어자만 그득한 곳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내 아이들의 학교는 지역적인 특성상 동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일본사람을 제외하곤 학교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동양 엄마들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만 왠지 외모에서 느끼는 친근함 때문인지 쉽게 말을 트게 된다. 셋째는, 아이들을 '영어만 할 줄 아는 아이' 로 자라게 하는 환경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TV나 거리 곳곳에서 매일 들려오는 광동어를 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영어권’ 만이 아닌 언어 환경이 '국어나 중국어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고 난 믿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온통 영어만 들리는 지역보다 영어실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난 오히려 그런 융통성 있는 환경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셋째는, 아이들을 '영어만 할 줄 아는 아이' 로 자라게 하는 환경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TV나 거리 곳곳에서 매일 들려오는 광동어를 꽤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영어권’ 만이 아닌 언어 환경이 '국어나 중국어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고 난 믿고 있다. 사방팔방에서 온통 영어만 들리는 지역보다 영어실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나 난 오히려 그런 융통성 있는 환경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