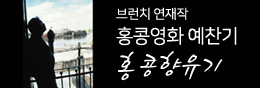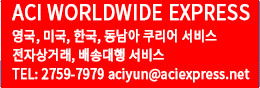- [제126호, 5월19일]
나의 큰 아이는 4년간 한국학원을 쉬다가 6학년 2학기에 복학(?)했고 둘째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녀 현..
[제126호, 5월19일]

나의 큰 아이는 4년간 한국학원을 쉬다가 6학년 2학기에 복학(?)했고 둘째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녀 현재 5학년이다. 큰 애를 쉬게 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담임선생님의 목표 수준이 너무 높아 일주일 내내 조금씩 나누어 숙제를 해도 과제를 다 감당해 내기가 꽤 버거웠고 그러다 보니 때론 엄마 숙제가 되기도 해 회의(懷疑)가 들었다. 다니던 국제학교의 토요일 축구경기를 놓치기 아까운 심산(心算)도 있었다. 잠깐 쉰다는 것이 4년이 훌쩍 지나버렸고 또래와의 어마어마한 격차로, 놓친 학년의 교과서를 구해다가 아빠의 특별보충을 받아가며 겨우 적응해 갔다.
이런 시행착오 덕에 한 치의 갈등이나 주저함 없이 한국학원 가는 것이 둘째에겐 토요일 오전의 붙박이 스케줄이 되었고 숙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챙기며 도와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선생님이 내주시는 숙제의 양이나 기대수준도 여기서 태어난 딸에게 비교적 적절한 수준이라 여기고 있다. 그 애의 일기를 읽으며 영어식 한글 표현을 자꾸 고쳐주다 보면, 더디지만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남을 보는 것도 나에겐 쏠쏠하며 아이는 아이대로 주중에 다니는 학교에는 없는 '매점'에서 요것조것 사 친구들과 주전부리하는 낙도 큰 것 같다. 반면 '국어'과목에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는 큰 아이는 금요일 오후면 때때로 토요일의 축구연습이나 기타 다른 계획을 꺼내며 내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 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안됨'을 선언해 버리는 엄마의 단호함에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形狀)' 을 하고 집을 나설 때도 있으나 다른 애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한 '국사' 만큼은 흥미를 보이며 가끔씩 아는 척도 하니 다행스럽다.
난 한인회에 회비 꼬박꼬박 내고 교민소식지 받아보는 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대입으로 바빠지기 전 중학교 때까지만 이라도 토요학교는 꼭 보내라고 권하고 싶다. 정해진 학기에 따라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틀이 있어야 엄마도 맘을 다잡아 지속적인 관심의 끈을 잡고 있을 수 있으니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곳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점(利點) 또 한 가지를 십분 활용들 하시라고 이 엄마 웅변대회에 나온 연사(演士)같이 힘 있게 주장하는 바이다.
 오! 필승! 봉순영
오! 필승! 봉순영
작년 연말 오래된 친구가 이 곳을 방문하며 사다 준 캔 속의 번데기는 유리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뜨뜻하게 데워 남편과 내가 와인 한잔과 함께 하는 귀한 안주이자 영양 만점의 간식인데 입맛에 있어서는 비교적 토속적인 내 아이들조차 집안 가득 폴폴 풍기는 그 냄새에 코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며, 엽기적인(?)식품의 모양새와 서로 더 먹겠다고 아귀아귀 쩝쩝 씹어대는 우리를 번갈아 희한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30년 입맛의 세대 차가 크긴 큰가 보다. 그런데 지난 4월, 이런 세대 차를 훌쩍 뛰어넘어 하루 한 시간이나마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때론 같이 애잔한 감상(感傷)에 젖어 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그… '오!!! 필승!'
아리랑 티브이의 케케묵은 드라마나 황금시간대에 공중파를 탄 '대장금', '허준' 도 아이들과 더불어 보곤 했으나 어려운 궁중말씨나 옛 표현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현대물인 '오! 필승'조차도 늙은 우리는 웃지만 아이들은 왜 웃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대목도 있긴 했다. 하지만 "지난 12년 홍콩에서의 가족사에 이만큼 네 식구를 골고루 만족시킨 드라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할 만큼 2년 전의 중고 드라마 (아리랑 티브이 드라마에 비하면 최신 중의 또 최신작이라 할 수 있지만)속 주인공 '필승' 아니 우리의 '안재욱' 은 삼순이보다도 장금이보다도 훨씬 내 가족에게 초강력의 펀치를 날려버렸다.
힘겹게 하루 일을 마친 노동자가 소주 한잔 걸치며 하루의 고달픔을 달래듯, 이리저리 손 많이 가는 두 애의 엄마였던 90년대의 나의 하루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마감되곤 했다.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좀 나아졌을는지 모르겠으나 그 때는 드라마 비디오라는 것이 글쎄, 계절마다 한 번씩 '극장' 구경 가곤 하던 나 어릴 적 식모언니 따라가 보던 동도 극장의 '문희' 주연영화 같이 화면에 비가 쫙쫙 내리는가 하면 일부러 명도 낮춘 화면처럼 주인공의 옷이며 얼굴은 때깔이 칙칙한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그 땐 우리나라 드라마에 뭐가 그리도 배고프고 아쉬웠는지 낡은 테이프에 몇 번이고 재녹화된 테이프들을 적잖은 돈을 내가며 감지덕지 빌려오곤 했으니…이젠 대박 터뜨린 드라마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소나기 온 뒤 올려다 본 활짝 개인 하늘만큼이나 깨끗한 화면으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으니 참으로 통쾌하지 않은가. 게다가 몰아서 보느라 잠 못 자고 중독될 염려도 없으니 홍콩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사실 내 애들은 드라마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와 돌아다닌다는 것, 배경으로 나오는 왠지 끌리는 풍경들, 그 속에 담긴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딸애의 경우엔 아마도, 쌍둥이 'Olsen' 자매나 'Hilaryduff'의 영화만큼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항상 바퀴 달린 발인 양 종종걸음 치며 하루 종일 집안을 누비고 다니는 엄마가 자신과 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 웃고 깔깔대는 그 시간이 그냥 좋나 보다. 꼭 드라마 볼 때만 그래야 하나 어떤 이는 딴죽 걸고 싶기도 하겠지만 광고 나오는 중간 중간 함께 얘기 나누며 퍼져 하하 웃을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참 괜찮은 것 아닌가. 픽션이란 장르상 어쩔 수 없는 우연의 연속 안에서 좀 부풀려진 인물의 성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필승'이란 인물을 보면서 "키 좀 작고 다리 짧아도 좋다. 저렇게 따뜻한 담요(이건 나의 표현이 아닌 드라마 속의 묘사)같은 사람이 되라." 얘기해 가며, 요즘 들어 예쁜 구석 찾기가 참 힘들어진 사춘기 아들과의 요원했던 관계 개선에도 톡톡히 한 몫 했으니 이 시점에서 '바보상자'라는 말 들으면 듣는 티브이 기분 나쁘지 않겠는가.
기저귀 찰 때 왔어도(다른 애들보다 워낙 늦게 떼는 바람에), 여기서 나고 자랐어도, 우리나라 드라마만 나오면 흘깃거리며 그저 흐뭇한 내 아이들… 'Linda Ronstadt' 나 'Eagles' 가 부른 'Desperado' 는 분위기 있는 날 들어야 와 닿지만 '심수봉'의 '사랑 밖에 난 몰라'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화장실에 앉아) 들어도 감정이 펄펄 살아나는 나와 참 닮은꼴이란 생각이 든다.
(계속) 글 ; J. Y. JEEN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05월 15일 (수)
▣ 심천, East Rail 노선을 홍콩과 연결하고 로후항에 공동 검사구역 도입해 심천-홍콩 간 50분 내 이동 목표
▣ 행정회의, 14일(화) 택시 요금 인상안 승인. 신계, 란타우 택시 기본요금 HK$2 인상 예정
▣ 홍콩 국제공항 출발 승객, 내년부터 항공권료에 포함되는 보안요금 HK$55에서 HK$65로 인상
▣ 홍콩 관광청, 개인 여행자 제도에 포함된 신규 8개 중국 도시 관광객에게 HK$200 쿠폰 배포
▣ 홍콩 직장인 도보 통근 비율 11%. 베이징(53%), 상하이(47%)에 비해 매우 저조
▣ 어제 열린 Global Prosperity Summit 2024에서 비즈니스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이 홍콩의 탈세계화에 대해 논의
▣ 홍콩 자키클럽, 자금성과 협력하여 중국 문화와 예술기술 인재 양성 위해 5년 프로젝트 추진
▣ Urban Jam Festival, 17일(금)~19일(일) / 25일(토)~26일(일), 코즈웨이 베이에서 도시 문화・음식・음악 중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 제공 예정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05월 15일 (수)
▣ 심천, East Rail 노선을 홍콩과 연결하고 로후항에 공동 검사구역 도입해 심천-홍콩 간 50분 내 이동 목표
▣ 행정회의, 14일(화) 택시 요금 인상안 승인. 신계, 란타우 택시 기본요금 HK$2 인상 예정
▣ 홍콩 국제공항 출발 승객, 내년부터 항공권료에 포함되는 보안요금 HK$55에서 HK$65로 인상
▣ 홍콩 관광청, 개인 여행자 제도에 포함된 신규 8개 중국 도시 관광객에게 HK$200 쿠폰 배포
▣ 홍콩 직장인 도보 통근 비율 11%. 베이징(53%), 상하이(47%)에 비해 매우 저조
▣ 어제 열린 Global Prosperity Summit 2024에서 비즈니스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이 홍콩의 탈세계화에 대해 논의
▣ 홍콩 자키클럽, 자금성과 협력하여 중국 문화와 예술기술 인재 양성 위해 5년 프로젝트 추진
▣ Urban Jam Festival, 17일(금)~19일(일) / 25일(토)~26일(일), 코즈웨이 베이에서 도시 문화・음식・음악 중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 제공 예정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법은역사적으로 영국의 교회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후 세속법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점차 보통법 (Common Law)의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법은역사적으로 영국의 교회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후 세속법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점차 보통법 (Common Law)의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라이프정글협회 드래곤보트 팀 모집 안내
라이프정글협회 드래곤보트 팀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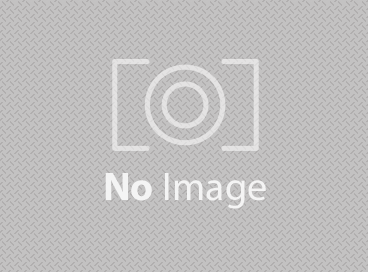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989호] 2024년 05월 10일
[989호] 2024년 05월 10일

 목록
목록




 나의 큰 아이는 4년간 한국학원을 쉬다가 6학년 2학기에 복학(?)했고 둘째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녀 현재 5학년이다. 큰 애를 쉬게 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담임선생님의 목표 수준이 너무 높아 일주일 내내 조금씩 나누어 숙제를 해도 과제를 다 감당해 내기가 꽤 버거웠고 그러다 보니 때론 엄마 숙제가 되기도 해 회의(懷疑)가 들었다. 다니던 국제학교의 토요일 축구경기를 놓치기 아까운 심산(心算)도 있었다. 잠깐 쉰다는 것이 4년이 훌쩍 지나버렸고 또래와의 어마어마한 격차로, 놓친 학년의 교과서를 구해다가 아빠의 특별보충을 받아가며 겨우 적응해 갔다.
나의 큰 아이는 4년간 한국학원을 쉬다가 6학년 2학기에 복학(?)했고 둘째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녀 현재 5학년이다. 큰 애를 쉬게 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담임선생님의 목표 수준이 너무 높아 일주일 내내 조금씩 나누어 숙제를 해도 과제를 다 감당해 내기가 꽤 버거웠고 그러다 보니 때론 엄마 숙제가 되기도 해 회의(懷疑)가 들었다. 다니던 국제학교의 토요일 축구경기를 놓치기 아까운 심산(心算)도 있었다. 잠깐 쉰다는 것이 4년이 훌쩍 지나버렸고 또래와의 어마어마한 격차로, 놓친 학년의 교과서를 구해다가 아빠의 특별보충을 받아가며 겨우 적응해 갔다.  오! 필승! 봉순영
오! 필승! 봉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