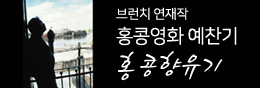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 [제134호, 7월21일]
둥글게둥글게 앉아 맞은 편 사람을 훤히 볼 수 있었던 '입석버스' 라 불리던 시내버스들…..
[제134호, 7월21일]
둥글게둥글게 앉아 맞은 편 사람을 훤히 볼 수 있었던 '입석버스' 라 불리던 시내버스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로 시작되는 누런 골판지에 적힌 사연과 롯데껌 한 통이 내 옆에 앉으신 엄마 무릎에 자주 놓여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려면 내 의지완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었다. "배가 고파요!" 라고 절규하듯이 반복해대는 한 어머니와 그 품에 안긴 서너 살 됐음직한 꼬질꼬질한 어린아이. 예배드리고 막 나오는 발걸음들이다 보니 그 모녀에게 돈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으나 매주 찾아오는 것을 알아차려 버린 후엔 다들 덤덤하다 못해 무관심하게 지나치곤 했다. 나도 처음엔 안타까움과 측은함이 반반 섞인 눈으로, 돈을 놓아둔 적도 몇 번 있었으나 나중엔 '또 저 소리네' 하면서, 하필 교회 앞을 본거지로 삼아 매주 찾아오는 그 엄마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여 "배가 고파요" 울부짖을 때마다 괜시리 내가 민망해졌다.
결혼한 해에 나는 태교(胎敎)도 할 겸 일본어학원에 다녔었는데 좌석버스를 한 번 타면 학원이 있던 시내로 진입 할 수 있어 참 편리했다. 근데 버스가 사당동에 다다를 무렵이면 항상 한 아저씨가 올라타 물건을 팔곤 했는데 아저씨의 태도가 내가 느끼기에 좀 위협적이었다고나 할까. 물건을 내 앞에 툭 던져놓는 폼이 내내 사람을 왠지 껄끄럽고 불편하게 했다. 학원 시간은 항상 같은 시간, 그 아저씨 또한 맨날 일정한 시간에 같은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올라타곤 세 정거장쯤 후에 내리곤 했으니 학원에 갈 때마다 그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언젠가부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격지심이었는지는 몰라도 내 얼굴을 알아보곤 안 팔아준다고 분노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결국 산달(産月)이 다되어 학원을 그만두면서야 비로소, 좋던 싫던 봐야만 했던 극히 일방적이던 그 아저씨와의 만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그리워 그리워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도 얼마 안지나 홍콩이 슬며시 생각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이다. 워낙 길눈이 어두운 나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실수할 가능성이 적고 막히지도 않는 전철을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 한 번에 가면 몰라도 중간에 갈아타려 하면 보통 계단을 거쳐야 하든지 이리저리 꽤나 걸어가야 한다. 구룡역에서 홍콩역을 거쳐 센트럴역으로 걸어가는 길같이 예외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로 건너편 또는 극히 가까운 곳에서 MTR을 갈아탈 수 있게 바쁜 승객의 동선을 한껏 고려해 만들어 놓은 '홍콩의 MTR'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전철 안, 요즘엔 휴대전화를 안 가진 이가 거의 없는 세상이라 여기저기서 통화하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홍콩인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과묵한 편이다. 서울에서는 전철로 움직이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라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눈 감기가 무섭게 갑자기 들려오는 상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를 방해한다. 그가 지나가고 나면 한껏 구슬프게만 들리는 찬송가 멜로디와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아저씨. 한번은 정말이지 요란한 음악소리에 놀라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눈 떠보니 CD를 판매하는 이의 선전용 음악소리였다. 그런데 웬 걸,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무색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거의 개의치 않는 듯 했다. 미니버스에서 다른 사람을 사이에 두고 일행인 두 사람이 침 팍팍 튀도록 있는 대로 떠들어도 승객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듯 한 표정을 가진 홍콩 사람들 같이…. 길가에서는 물건 파는 이들을 많이 보았지만 전철에서는 생전 처음 그런 광경을 접한 딸애는 "엄마 저 사람 뭐하는 거야?" "찬송가는 왜 틀어?" 묻는다. 한 세대 전의 입석버스 시절부터 그저 당연시 여겨지던 대중교통을 이용한 행상인의 역사가, 잠깐 방문한 나의 눈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제해야 할 관리자나 겪는 시민을 익숙하게 만들어 그냥 방치해두는 무감각의 전통이 된 것 같다.
80년대의 '인간시대'나 요즘의 '인간극장'과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지하철 행상인들의 하루를 취재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물건 팔기에 가장 적합한 노선 별 시간대에 맞춰 움직였으며 동료(?)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순서도 안배하는 등 나름의 요령과 상도덕(商道德) 또한 존재했다. 연출자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서가 그렇듯이, 그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보다는 그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역시 그들의 신산(辛酸)한 삶을 단칼로 자르듯 외면하려는 것은 아니나 전국체전 입장식 하듯 끊임없는 그들의 출현과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Too Much"란 생각에 전철 타는 일이 솔직히 좀 짜증스럽다.
사틴에 갈 일이 있어 탄 KCR에서 시골장터를 방불케 하는 기차 안의 왁자지껄함에 아연실색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철 안의 무조건 참아야 하는 행상인들의 소음보다는 낫지 않나 싶다. 게다가 이곳 역사(驛舍) 안엔 많은 편의 시설이 들어차 있어 그야말로 지하에 펼쳐진 또 다른 세상이라 하겠다.
예전에 MTR을 탔을 때 긴 의자의 중간쯤에 앉으면 내내 신경이 쓰이고 불안했다. 엉덩이와 허리의 굴곡에 맞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의자이긴 하지만 미끈한 감촉의 치마라도 입을 시엔 빤질빤질한 금속으로 된 의자 표면 때문에 전동차가 움직일 때마다 엉덩이가 이리저리 나도 모르게 좌우로 쏠리는 것이 어느 순간 바닥으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게다가 중간 자리엔 딱히 잡을 것도 마땅치 않으니 그저 엉덩이에 힘을 탁 주고 최대한 금속의자와 밀착시킬 수밖에.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나라는 푹신하고 따뜻한 알록달록한 쿠션 같은 곳에 엉덩이가 닿는데 여긴 왜 이리 차갑고 미끈거려. 정 없게시리.' 의아해했다. 그러나 몇 년 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접하고는 MTR 의자가 왜 금속이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달리 열차 사이사이에 문이 없어 맘대로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 비상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새삼 알아차리게 되었다. 게다가 요즘엔 많은 역에 덧문이 설치되어 있어 기다리는 동안 위험한 선로를 보고 있지 않아도 되니 아들이 MTR혼자 타고 다녀도 꽤 안심이 된다.
좁은 땅에 어울리지 않게 세계의 비싸고 큰 자가용차들이 잔뜩 모여 있는 홍콩이지만 차 없는 이들, 택시 타기 부담스러운 이들이 결코 서럽지 않도록 한껏 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살면 살수록 새록새록 드는 걸 보면 나의 홍콩 대중교통 예찬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 계속 / 글 ; J.Y. JEEN )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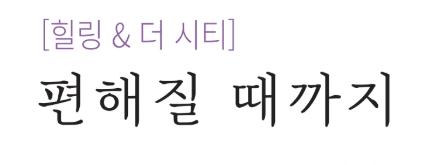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