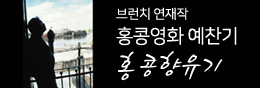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 [제152호, 12월1일]
목소리로 듣던 메밀묵 장수를 / 골목 어귀에서 만났네 /
커다란 함지박을 이고 /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 그이는 /
주름살..
[제152호, 12월1일]
목소리로 듣던 메밀묵 장수를 / 골목 어귀에서 만났네 /
커다란 함지박을 이고 /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 그이는 /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 / 뜨신 방에 엎드려 메밀묵 사이소를 들을 때 /
남정네 중에서도 장골의 목청 같던 / 걸걸한 외침이 쪼그라든 할머니라니…
(시인 최영철씨의 '메밀묵 장수' 중에서)
엄마가 나를 낳으시던 11월의 그 날 밤에도 메밀묵 장수 아저씨의 코와 귀 끝은 그리도 맵고 빨갰을까.
입동도 지나고 소설[小雪]무렵인 나의 생일은 항상 매서웠다. 첫 추위가 지난 후 다시 순해진 날씨는 내 생일 즈음이면 다시 살벌해지곤 했는데…
첫 아이가 만 4살이 되자, 아이 하나 더 낳으면 내 성[姓]을 갈 거라던 나도 '이젠 둘째를 가져야 할 때' 란 생각이 들었다. '맘만 먹으면 단번에' 라며 큰 소리를 쳤는데 어찌된 일인지 소식이 없었다. 결국 다음 달에야 딸애를 갖게 되었는데 지금도 난 그것을 참 다행이라 여기고 있다.
딸의 생일은 성탄 분위기로 온 동네가 물드는 크리스마스 직전인데 하마터면 이 엄마 생일처럼 움켜쥐면 금방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건조무미한 11월 끝자락이 될 뻔 한 것이다. 홍콩에서 딸이 태어나고, 나는 '진 (陳)'보다는 10여 년 넘게 '미세스 문'으로 불리고 있으니 성을 갈긴 간 것인가 보다.
유신체제와 학력고사
유신헌법 통과를 위한 국민투표로 임시공휴일이던 어린 시절 내 생일날 아침, 집 마당 수돗가엔 갑자기 얼음이 꽝꽝 얼어붙었고 두 해에 걸쳐 학력고사를 치르느라 미역국도 못 먹었던 그 날엔 누가 입시[入試] 아니랄까 봐 허연 입김이 팍팍 나왔다.
그리하여 난 우리 집에서 가장 "독한 애"가 되고 말았는데 그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성질머리 독한 사람 생일은 춥다는 전설을 주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갖다 붙인 말이었다.
내가 태어난 달이지만 난 꼬마 적부터 11월이 참 싫었다. 일요일 한 줄 빼곤 빨간 색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 삭막함에다 날씨 또한 스산음산해서 주로 감기를 달고 살았고 성적 또한 11월만 되면 뚝 떨어져 엄마에게 혼이 나는 징크스까지 있었다. 이웃한 10월이나 12월에 비해 걔는 또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없는가.
내가 중학교 땐 13579 하루건너 논적도 있었고, 유엔가입도 안 했으면서 70년대 중반까지는 유엔 데이(24일)까지 찾아 놀았던, 월급쟁이들은 줄었다줄었다 불평해도 여전히 빨간 날이 많은 10월과 달력을 한 장 쫙 넘겨보면 배경 그림부터 화사한 것이 달뜨게 하는 12월 사이에 콕 껴 있으니 우리나라의 11월은 정말 빼빼로 과자처럼 앙상해 보인다.
나에게 12월의 눈은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라는 동요가사가 떠오르거나,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노랫 속 선녀님이 뿌려주는 떡가루같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반면 11월에 내리는 눈은 가슴 설레는 첫눈을 제외하곤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겉은 이지적이고 아름다우나 서늘하도록 차가웠다.
역시 내 생일…
30년 가까이 고착되어 있던 11월의 감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여기 살게 되면서부터 이다. 지인들이 "언제가 가장 놀러 가기 좋은 계절이냐"고 물으면 난 "11월이야" 자신 있게 대답하곤 하는데 중순쯤 홍콩 나름의 첫 추위가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의 11월은 쾌적하고 보송보송하다. 나같이 북(서울)에서 온 여자는 최적의 날씨를 만끽하며 힘든 하루를 보상받을 만큼 이상적인 달로 느껴진다.
허나, 내 귀빠진 날 무렵이 되면 역시 '홍콩수준'의 추위가 오곤 했는데…
올해는 9월 중순쯤 늦더위 대신 이상하게 시원하더니만 10월 11월은 영 예전의 그 날씨가 아니다. 보송하긴 커녕 며칠 전엔 습도가 90%를 웃돌지를 않나 중순쯤 한 번은 왔다갔을 14,15도 정도의 최저 기온은 내가 글 쓰는 현재까지는 아직 아침 방송 상단에 등장한 적도 없다.
온도는 그러하나 역시 나의 생일은 그 값을 십분[十分] 발휘했다. 전날까지 온화하던 날씨가 아이들 학교 보낸 후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더니 여름 같은 폭우에 천둥 번개까지 몰아쳐댔다. 기온이 안 받쳐주니 대신 비바람이 내 생일임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신선한 아침공기를 뼈 속 깊이 들이마시면서 시작한 11월이 이렇게 빡빡할지는 몰랐다. 아이들도 나도 분주하고 피곤했으며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맘이 상하는 일도 있었고 몸도 많이 안 좋았다.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말해 놓곤 아직도 그 가족을 초대 못했으며 좋아하는 바비큐도 단 한 번 밖에 못 갔다. 제대로 못 본 신문은 거실 여기저기 수북이 쌓여있고 서울서 한 번 보곤 '김영애 아줌마'의 카리스마에 반한 사극 '황진이'를 KBS World에서 방영 하길래 녹화해서 꼭 봐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 보고 있다.
여백의 미(美)
유난히 푹한 날씨 때문에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12월은 12월이다.
무슨 날 대목엔 유난히 발 빠른 이 곳 사람들 덕에 고층 건물이나 상가는 이미 성탄과 연말이 되어 버린 지 꽤 되었고 집치장에 게으른 나도 창고에서 성탄트리를 끄집어내 1년에 한 번은 환경미화를 할 때가 되었다.
원래의 의미보다는 상업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쇼핑센터의 분위기이기는 하나 삭막한 11월의 끝자락에 보는 빨강과 초록의 물결은 눈을 통해 맘까지 푸근하게 한다. 지난 주 몸이 아플 때 꺼내 들었던 'Kenny G'의 'Holiday Album'의 캐롤들도.
벌써 이것저것 계획표에 채워져 있긴 하지만 12월엔, 되도록이면 애들 방학하기 전---
새로운 일은 벌이지 말고 몸도 맘도 정리하며 보낼 것.
음악 듣고 밀린 신문 훑으며 여유도 가져볼 것.
그 가족 초대해 정담 나누며 밥도 같이 먹어볼 것.
'황진이'도 좀 볼 것.
예쁜 카드 펼쳐 연필 들고 살뜰한 그리움으로 정성껏 채워 볼 것.
항상 종종걸음치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성큼성큼 걸어 다니는 나지만 때론 일부러 오른 편에 가만히 서서 이사람 저사람 구경하며 내려가고 내 뒤 멀찍이 떨어져 오는 사람에게조차 문을 잡아주며 기다려 주는 작은 행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혼자 닫히도록 내버려 두며 반사되는 문에 비친 내 모습을 잠깐 바라보는 순간의 여유만으로도 내 속에 여백이 숨쉼을 느낄 때가 있다.
올해의 마지막 달엔…
생각해 보면 하기 어려운 일도 아닌 소소한 즐거움들, 이일 저일로 종종걸음 치다가도 가끔씩 멈춰 서서 보폭도 넓게 느릿느릿 맛보며 가봐야겠다.
<글 : 진주영 / 계속…>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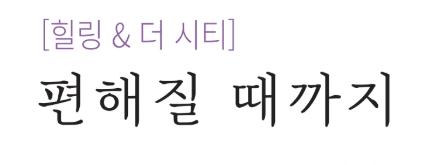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2일 (금)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2일 (금)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