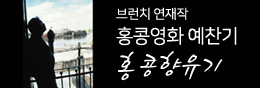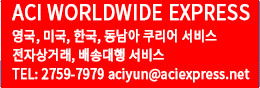- [제163호, 2월23일]
나의 부엌은 크기도 적당하고 냉장고도 가까이 있으며 색깔도 괜찮다. 그러나 내겐 좀 불편..
[제163호, 2월23일]
나의 부엌은 크기도 적당하고 냉장고도 가까이 있으며 색깔도 괜찮다. 그러나 내겐 좀 불편한 곳이다. 요즘 우리나라 부엌은 점점 가족과 가까워지는 추세라는데 외국인 핼퍼가 많은 이곳에선 오히려 거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현관 코앞에 입구가 있는 부엌에서 식탁에 상을 보려면 쟁반을 들고 몇 번씩 날라야 하고 널브러진 신발들을 가로질러야 하며 여정(?)도 길다. 설거지하면서 거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얘기할 것이 있을 땐 소리를 꽥꽥 질러야 한다.
언니와 그 겨울의 부엌
시멘트 바닥과 아궁이, 미닫이문이 달린 고동색 찬장들, 흔들거리는 백열전구... 연탄불이 시원찮을 때엔 한켠에 놓인 석유풍로가 톡톡히 제 몫을 했다. 부엌과 안방 사이엔 찌개그릇 하나 놓을 만한 평평한 공간을 품고 있는 나무 미닫이문이 달린 작은 창 같은 것이 있어서 밥 먹다 총각김치가 더 필요할 때면 우리 집에 있던 언니가 쫑쫑 썰어 거기에 떡 올려놓으면 엄마가 집어서 상에 놓아주시곤 했다. 옛날 그 정짓간엔 쥐도 가끔씩 출현해서 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만두를 빚는 날이나 딱딱해진 가래떡 연탄불에 구워 참기름 간장 찍어 먹던 날만 들어가고 평소엔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다.
점심까지 챙겨야 하는 겨울방학이면, 우리 집 일을 돕던 언니는 점심상 치운 후 저녁 짓기 전 내가 방학 숙제하던 방에 들어와 잠깐 눈을 붙이곤 했는데 언니가 내는 삐익삐익 콧소리가 신경에 거슬려 짜증이 좀 날 무렵이면 저녁 하러 추운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곤 했다.
그 후 바닥도 타일이고 더 넓은 부엌이 있는 집으로 옮겼지만 방과 연결되는 그 편리한 작은 공간이 없어 한동안 언니와 우리, 모두 불편해 했다.
평범한 샐러리맨이던 아버지가 승진하시듯 바닥 뜨습고 편리한 우리 집 부엌 크기도 점점 커져갔지만 난 그저 해주는 밥에 물이나 먹으러 왔다갔다 했다.
나의 부엌
시집 간 후 비록 셋집이지만 내가 부엌의 주인이 되었는데 대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크기라서 설거지를 미루고 쌓아놓기라도 하면 온 집안이 지저분해 보였고 비좁은 공간 때문에 화장실 문 바로 앞에 놓인 식탁에서 밥도 먹고 가계부도 썼다
2년 가까이 살았던 결혼 후 세 번째 집 연립주택의 부엌은 좀 춥긴 했지만 창이 있어 좋았다. 창으로 보이는 그리 화려하지 않은 앞집의 뜰과 사람들... 꼭 내 아들 만하던 손자가 오는 날이면 그 집 주인장은 손자를 안고 마당의 꽃을 보여주며 뺨을 비비시곤 했다.
그 즈음엔 아들이 한창 집안을 후벼 파고 다닐 때라 부엌 서랍이란 서랍은 다 난장판을 만들기 일쑤였고 나의 로션들은 화장대를 떠나 다 집안 꼭대기로 높이높이 올라갔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엌도 좁고 정신없고 살림도 빠듯하던 그 시절이 내 생애(?)중 가장 열심히 요리에 심취했던 기간이었다. 남편이 요즘 가끔 식탁이 너무 간소하다고 얘기하면, 예전 그 3 여 년 동안 평생 먹을 맛있는 요리 압축해서 이미 다 해 줬으니 불평 말라고 농담반 진담반 반응한다.
네 번째로 진짜 나의 부엌을 가지게 되어 흰 싱크대에 색 맞춰 냉장고에 접착시트도 붙이고 부엌가구 선전에 나오는 우아한 주부 티를 낸 것도 잠시, 모두 다 내려놓고 홍콩으로 오게 되었다.
'바퀴 주거지'와 '아주 오래된 부엌'
현관 바로 옆에 위치한 부엌은 협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수납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한국인 살림에 맞춰 구입한 냉장고는 마루 한켠에 놓아야 했기에 요리 준비하려면 왔다 갔다 하느라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개수대 배수구 구멍은 어찌나 작은지…
지금도 눈에 선한 어설픈 그 부엌… 홍콩에서의 첫 4년을 보내며 산모 미역국도 끓여 먹었고 졸린 눈 비비며 둘째 아기 우유도 타고 손님도 많이 치렀다.
홍콩에서의 세 번째 부엌이 바퀴벌레 소굴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사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아마도 내 자신이나 아이들 남은 생에 그때보다 더 많은 바퀴벌레를 매일 보며 살 일은 없을 거란 확신이 든다. 문 앞에 Notice 붙이고 관리실에 알리고 연막탄을 여러 차례 터트려도 우리 잘 때 다 기어 나와 화생방 훈련을 하도 해서 낡은 마루 바닥 틈새로 다 대피하는지 독하디 독한 바퀴들은 오히려 늘기만 했다. 1년 만에 그 집을 떠나기 전날 행여 이삿짐에 묻어올까봐 부엌 용품들을 일일이 닦고 확인하며 참으로 힘겹게 이삿짐을 쌌다.
홍콩 온지 7년 만에야 넉넉한 사이즈의 깔끔한 부엌이 단 1년 내 차지가 됐는데 아이들 숙제라도 봐주는 날이면 수북이 쌓인 설거지를 늦은 밤까지 하는 날이 잦았고 가장 넓고 쾌적한 부엌에서 가장 음식을 잘 해 먹지 못했던 시기였다.
수리는 했다지만, 그 때의 딱 내 나이와 비슷하던 36 년 된 옛날 옛적 구조의 집에 있던 다섯 번째 부엌은 좀 촌스럽기는 했지만 쟁반이 필요 없게끔 식탁과 가까워서 맘에 들었다. 고가(古家)였지만 바퀴는 살지 않았다. 3층이던 우리 집 창 밖엔 푸른 고목이 있었고 맞은 편 건물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인도 학생도, 매일 밤늦게까지 마작 하는 가족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공부하던 학생이 더 이상 안 보이 길래 아마 그 형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외국으로 갔나보다고 아들과 얘기했다.
신산[辛酸]한 세월을 버텨왔으나 푸르기만 한 늙은 나무를 앞에 두고 이모저모 사람 모습을 보며 일 할 수 있는 집이어서 많은 위안이 되었다.
멀리 더 멀리
거실과 멀다보니 여름엔 집에서 가장 덥고 겨울엔 가장 추운 곳이 요즘 내가 머무는 부엌이다. 방충망을 단 관계로 창을 계속 열어놓는데 추운 날엔 소파에 앉아 히터를 안고 있다보면 엉덩이가 쇳덩이같이 처져 정말 부엌 들어가기가 치질환자 화장실 들어가는 것만큼 싫을 때가 있다. 게다가 부엌 창 밖은 그야말로 회색 그 자체... 건물들이 만나는 사각지대로, 보이는 것은 나란히 쪼로록 창의 불빛들뿐이다.
햇볕도 올 듯 하다가는 저만치 가버리고 네모만 보이는 부엌을 그래도 좋아해 보려고, 골동품 같은 레코더를 가뜩이나 좁은 부뚜막 위에 갖다 놓고 70년대부터 2천 년대까지 30년을 어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듣고 또 듣고 추울 땐 가장 좋아하는 뽀레이차를 고무장갑 낀 손으로 홀짝대며 마신다.
욘사마에 열광하는 일본 할머니 같은 열정이라도 있다면, 중학교 때 '여학생'잡지에서 오려낸 '레이프 가렛' 사진 벽에 붙여놓고 흐믓했듯이 부엌 한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배용준' 브로마이드라도 걸어놓고 부엌을 사랑하련만….
그래도 옛날 그 겨울의 부엌에 비하면 이 얼마나 편리하며 뜨스운가. 코 곤다고 불평 말고 언니 내 옆에서 눈 붙일 때 이불이라도 잘 덮어줄 것을... 겨울에도 반팔 입던 서울의 아파트 주방에서는 몰랐던 언니의 수고가 30 여 년이 지난 지금 홍콩의 조금 추운 부엌에서 슬프도록 고맙게 느껴진다.
해도 안 들고 음습해도 그래도 나의 부엌이 참 좋은 점 하나... "아직까지 바퀴벌레는 없으니 그 아니 기쁘지 아니 한가"
<글 : 진 주 영 / 계속>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05월 15일 (수)
▣ 심천, East Rail 노선을 홍콩과 연결하고 로후항에 공동 검사구역 도입해 심천-홍콩 간 50분 내 이동 목표
▣ 행정회의, 14일(화) 택시 요금 인상안 승인. 신계, 란타우 택시 기본요금 HK$2 인상 예정
▣ 홍콩 국제공항 출발 승객, 내년부터 항공권료에 포함되는 보안요금 HK$55에서 HK$65로 인상
▣ 홍콩 관광청, 개인 여행자 제도에 포함된 신규 8개 중국 도시 관광객에게 HK$200 쿠폰 배포
▣ 홍콩 직장인 도보 통근 비율 11%. 베이징(53%), 상하이(47%)에 비해 매우 저조
▣ 어제 열린 Global Prosperity Summit 2024에서 비즈니스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이 홍콩의 탈세계화에 대해 논의
▣ 홍콩 자키클럽, 자금성과 협력하여 중국 문화와 예술기술 인재 양성 위해 5년 프로젝트 추진
▣ Urban Jam Festival, 17일(금)~19일(일) / 25일(토)~26일(일), 코즈웨이 베이에서 도시 문화・음식・음악 중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 제공 예정
[모닝 하이라이트] 2024년 05월 15일 (수)
▣ 심천, East Rail 노선을 홍콩과 연결하고 로후항에 공동 검사구역 도입해 심천-홍콩 간 50분 내 이동 목표
▣ 행정회의, 14일(화) 택시 요금 인상안 승인. 신계, 란타우 택시 기본요금 HK$2 인상 예정
▣ 홍콩 국제공항 출발 승객, 내년부터 항공권료에 포함되는 보안요금 HK$55에서 HK$65로 인상
▣ 홍콩 관광청, 개인 여행자 제도에 포함된 신규 8개 중국 도시 관광객에게 HK$200 쿠폰 배포
▣ 홍콩 직장인 도보 통근 비율 11%. 베이징(53%), 상하이(47%)에 비해 매우 저조
▣ 어제 열린 Global Prosperity Summit 2024에서 비즈니스 리더들과 경제학자들이 홍콩의 탈세계화에 대해 논의
▣ 홍콩 자키클럽, 자금성과 협력하여 중국 문화와 예술기술 인재 양성 위해 5년 프로젝트 추진
▣ Urban Jam Festival, 17일(금)~19일(일) / 25일(토)~26일(일), 코즈웨이 베이에서 도시 문화・음식・음악 중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 제공 예정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법은역사적으로 영국의 교회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후 세속법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점차 보통법 (Common Law)의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법은역사적으로 영국의 교회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후 세속법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점차 보통법 (Common Law)의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라이프정글협회 드래곤보트 팀 모집 안내
라이프정글협회 드래곤보트 팀 모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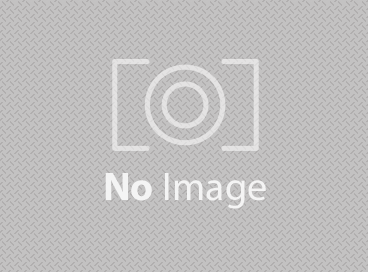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홍콩총영사관] 대한민국 입국 방역정책 정보 (2023. 3. 11. 현재)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서라벌 침사추이] Happy Mother's Day & Happy Father's Day
 [989호] 2024년 05월 10일
[989호] 2024년 05월 10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