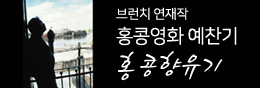떠남 그리고 만남고전장서들이 빼곡한 어느 석학의 책꽂이처럼 하루하루가 빽빽하게 돌아가는 내 삶에서 아주 가끔은 천우신조의 기회가 찾아오곤 한다. 그리고 나는 배낭을 꾸린다.
이번에도 그랬다. 제사보다 잿밥이라고, 해야 할 일들, 마무리해야 할 것들을 싸잡아 땡처리 하고는 세계한인언론인들의 행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곳 정동진을 향해 떠났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낭만적이 느낌이 흠씬 드는 정동진. 그냥 그래서였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낭만적인 느낌 하나.
조선시대 한양의 광화문으로부터 정확히 동쪽으로 내달으면 닿게 되는 바닷가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정동진(正東津)'이라는 것도, 바닷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라고 해서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고현정의 소나무가 정동진역 앞에 서서 오가는 행락객들의 모델이 되어준다는 사실도 내겐 전혀 중요치 않다. 위에서 말했다 시피 그곳이 '정동진'이어서 나는 좋았다. 더구나 30여 년 전에 헤어진 내 초등학교 동창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산다는 소식은 300년의 뿌리 깊은 소나무라도 당장에 뽑아 올릴 듯한 기세로 나를 세차게 잡아 당겼다.
사실 정동진이란 곳은 1박2일 일정으로 다녀오기엔 처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아니면 소화하기 힘든 만만치 않은 거리다. 서울에서 버스로는 3시간 30분, 기차로는 6시간 10분이다. 하지만 어디든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잠 들 수 있는 나 같은 행운아에게 그 시간은 좀비처럼 쓰러져 자면 딱 그만인 시간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회로 홰를 치다
성게야 성게야, 네 속을 보여주지 않으련?내 마음속에 있던 정동진은 바다를 끼고 있는 조그만 간이역이었다.
정동진역에 도착하자 친구 민주가 나와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년이란 세월은 찐빵의 이스트처럼 그 친구와 나를 빵빵하게 부풀려 놓았다.
변하긴 그 친구나 나나 마찬가지여서 동창생들이 만나면 의례 "어머머머 얘,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얘, 그대로야"하는 호들갑도 생략하고 정동진 터줏대감인 남편과 함께 민주가 운영하는 '산횟집' 2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민주를 끔찍이도 아끼는 그녀의 신랑은 홍콩에서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감격을 했는지 몇 번이고 혀를 내두르며 고마움을 전한다.
민주는 시장할테니 일단 요기부터 하라며, 광어와 삼순이(동해안 토속어) 한 접시, 금방이라도 기어나올 듯 엄청난 기세로 꿈틀대는 성게와 오징어, 전복, 멍게를 푸짐하게 한 접시 내온다.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3개 지역을 오르내리느라 끼니도 제대로 못 때운 내 뱃속이 회를 만나니 요동을 친다. 닭이 푸드덕대며 홰를 치듯 요동치던 내 뱃속에 생전 처음 보는 삼순이부터 초장에 발라 쓱쓱 집어넣으니 처녀를 제물로 받아먹은 괴물이라도 된양 잠잠해 진다. 맛있다. 삼순이도 맛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광어도 맛나다. 꿈틀대는 성게가 무섭긴 하지만 용기를 내서 가시를 잡고, 망고스틴의 흰 알맹이를 빼먹듯 티스푼으로 노오란 성게알을 퍼서 입안에 넣는다. 아! 이건 예술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혀에 닿자마자 아이스크림 녹듯 스르르 녹아내릴 수 있을까. 얇게 채쳐온 어린 오징어 회의 맛도 기가 막히다. 내가 먹어본 오징어 회 중 가장 입에 착착 붙는 맛이 바로 정동진의 오징어 회다. 민주의 말로는 지금이 딱 오징어 회가 맛이 있을 때란다. 조금 더 커지면 질겨지고 고소한 맛은 떨어진다고.
'성게'는 아직도 배를 몰고 고기잡이를 하시는 민주 시아버지가 직접 바다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꿈틀대는 성게 가시가 무서워 움찔움찔 놀라면서도 나는 계속 성게 뱃속을 휘젓는다. 한 접시의 성게를 다 해치웠더니 민주가 내려가 다시 밤송이 같은 성게를 한 접시 수북이 담아 내온다.
"자, 성게야 성게야 네 뱃속을 보여주지 않으련?"
/ 계속....
<글·사진 : 로사 권 rosa@weeklyhk.com>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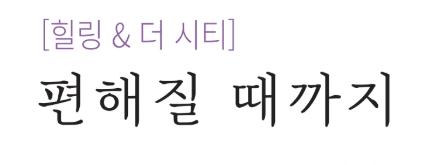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테니스협회]- 2025년 한인회장배테니스대회
홍콩한인회가 주최하고 홍콩한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홍콩한인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2025년 5월 1일(목) 주경기장은 Kowloon Tsai Park Tennis Courts, 금배부는 Coastal Skyline Clubhouse, Tung Chung에서 열렸다.대회경기결과금배부우승: 양근모 / 오영일 준우승: 김대준/ Xavier Bellier공동 3위:윤성민/김수성오승훈/Aron Yuen은배부우승: 심상훈 / 오승...
[홍콩한인테니스협회]- 2025년 한인회장배테니스대회
홍콩한인회가 주최하고 홍콩한인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홍콩한인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2025년 5월 1일(목) 주경기장은 Kowloon Tsai Park Tennis Courts, 금배부는 Coastal Skyline Clubhouse, Tung Chung에서 열렸다.대회경기결과금배부우승: 양근모 / 오영일 준우승: 김대준/ Xavier Bellier공동 3위:윤성민/김수성오승훈/Aron Yuen은배부우승: 심상훈 / 오승...

 [홍콩한인체육회]-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 성료
[홍콩한인체육회]-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 성료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3일 (토)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3일 (토)
 서라벌 - 홍콩판 "흑백요리사"에 참여
서라벌 - 홍콩판 "흑백요리사"에 참여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