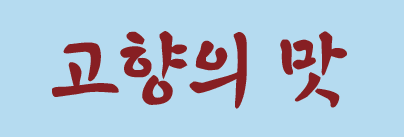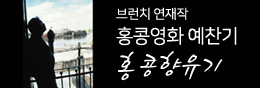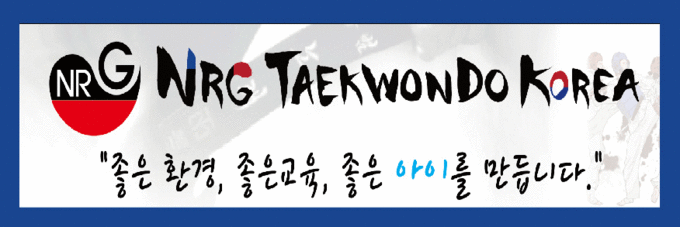- 어떤 한자말은 환경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한자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때문에 글로 쓸 때 자..
어떤 한자말은 환경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다. 한자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때문에 글로 쓸 때 자주 헷갈린다.
‘노(怒)’가 그런 한자말이다. ‘격노’ ‘분노’는 ‘노’로 적는다. 그런데 ‘크게 화를 내다’를 뜻하는 말은 ‘대노’가 아니라 ‘대로’다. ‘희로애락’도 ‘희노애락’으로 쓰면 틀린다. 똑같이 성낼 노(怒)자를 쓴다. ‘노’는 한자의 본음이고 ‘로’는 속음이다.
‘낙(諾)’도 마찬가지다. ‘허락’ ‘수락’을 보면 ‘승락’ ‘응락’으로 써야 할 것 같지만 ‘승낙’ ‘응낙’이 바른말이다. ‘낙’이 본음이고 ‘락’은 속음이다. ‘속음’은 어법에는 어긋나지만 본음보다 발음하기 편해 널리 쓰이는 습관음을 말한다. 말하기 쉽고 듣기에 좋다는 이유 때문에 속음으로 적는 것이다. 한글맞춤법은 ‘한자말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음을 써야 할지 속음을 써야 할지 발음으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무턱대고 외울 수도 없는 노릇. 해서 본음과 속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싶겠지만 방법이 있다. ‘모음’으로 끝나면 속음을 쓰면 된다. ‘대로’ ‘허락’으로 적는 이유다. ‘받침’으로 끝날 땐 ‘분노’ ‘승낙’처럼 본음을 쓴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나는 ‘희로애락’도 ‘로’로 써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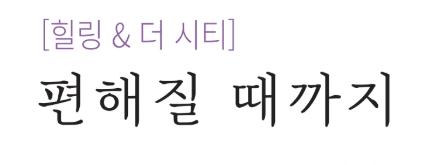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2일 (금)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2일 (금)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