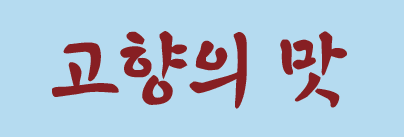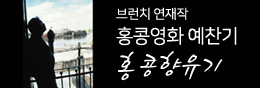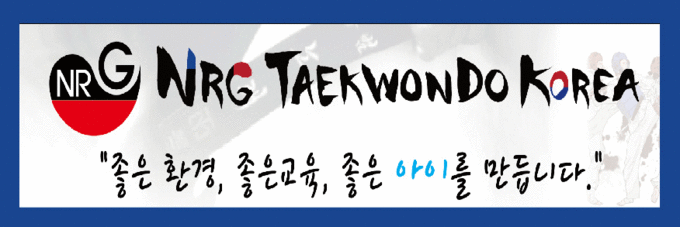- SAT는 1926년도부터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서 도입된 시험이다. Reading (독해) 400점 , Writing (작문/문법) 400점, 그리고 Math (..
SAT는 1926년도부터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서 도입된 시험이다. Reading (독해) 400점 , Writing (작문/문법) 400점, 그리고 Math (수학) 800점으로 16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대학 학업성취도를 예상해보는 시험이다. 2018년 현재, 미국대학이나 홍콩대학교, 그리고 한국대학 특례입학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은 SAT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성공적인 입시준비를 할 수 있다.
먼저 SAT는 한국 입시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능능력시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 입시를 겪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고3시절 경험에만 의지했을 때 상당히 비효과적일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입시 준비를 학생들에게 강요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능능력시험이나 학력고사는 어디까지나 지식 기반의 시험이다. 물론 습득한 지식을 상당 부분 응용을 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시험이고, 따라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접근방식이 거의 필요조건이 되는 시험이다.
하지만 SAT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필자는 먼저 SAT가 1994년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거두절미하고 94년도 이전에는 SAT가 거의 IQ 테스트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직접적인 IQ 테스트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IQ와 SAT 점수는 거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던 시험이다. 하지만 몇번의 개편을 거쳐서 2016년 개편된 New SAT 이후로는 영미권 학교 커리큘럼을 얼마나 잘 이수한 학생인지를 분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왜 대학들이 학생들의 SAT 점수를 유의 깊게 보는지는 간단하다. 일단 일차적으로 많은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서 SAT 점수와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번 증명되었고, 학생들의 졸업률과 수준 (시험성적)이 대학 랭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일차적으로 SAT 점수를 GPA와 같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SAT에서 리딩은 영단어 문제들이 없어지고 5개의 긴 지문과 그에 따른 문제들로만 구성된 형식으로 바뀌었고, 라이팅 섹션도 아주 분명한 문법 문제와 리딩과 비슷한 글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영미권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한 학생이라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법만 체화 시키고, 라이팅 섹션에서 나오는 문법의 오류 유형만 터득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즉, 학습으로 정복가능한 테스트란 이야기다.
표면적으로 대학(특히 미국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들은 입학사정관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점수뿐만 아니라 교내외 활동과 에세이까지 고려하는 “holistic approach”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실이긴 하나, 한국 학부모들은 이를 잘못 받아들여 상당히 혼동된 상태에서 입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서 숫자 또한 자신들의 랭킹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지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급한 이슈이다. 과연 점수를 가장 유의 깊게 보는 요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원자수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미국 상위 20위 이상의 대학들에서는 워낙 시험 점수가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차이가 과외활동에서 나겠지만, 대부분의 주립대학교나 20위권 밖의 미국대학교에서는 SAT 점수 (완벽에 가까운 GPA는 거의 필요조건, 자격요건 수준이다) 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다. 미국대학랭킹 30위 정도인 New York University에 지원하는 A라는 학생은 SAT 1400점, 그리고 수려한 과외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고, B라는 학생은 SAT 1500점, 그리고 과외활동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B라는 학생이 A라는 학생보다 훨씬 유리하다. A와 B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 A라는 학생이 아주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B가 합격자리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SAT점수가 학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지원서를 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 냉소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사실이다. 따라서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SAT 점수의 향상여지가 있는 학생들(1550점 이하)에게는 한 시간의 SAT 공부가 다른 공부나 과외를 한 시간 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줄 것이라고 필자는 자신있게 이야기해줄 수 있다.
과외활동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본다 하면, C라는 학생이 학교 운동선수, 심지어 Varsity athlete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서 C가 50시간을 운동에 더 쏟아넣는 것이 C의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까?
정답은 물론 확고한 “No”이다. C는 이미 원서에 포함 될 Varsity Athlete이라는 타이틀은 가진 상태이다. 대학들은 A가 그 활동에 50시간을 더 쏟든지 100시간을 더 쏟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운동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과외활동이 이에 포함 된다. 그에 반해서, C가 그 50시간을 SAT 공부에 쏟으면 어떨까? 상당한 점수 상승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A의 대학합격여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높은 SAT 점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필히 확보하는 것이 필자가 해주고 싶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입시 조언이다.
글: 다니엘 오 Daniel Daehyun Oh
(Daniel's SAT Clinic: blog.naver.com/danielacademy)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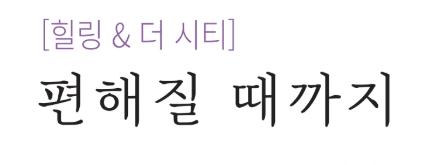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