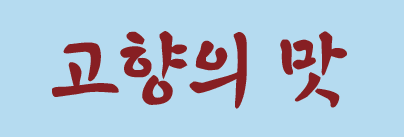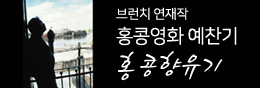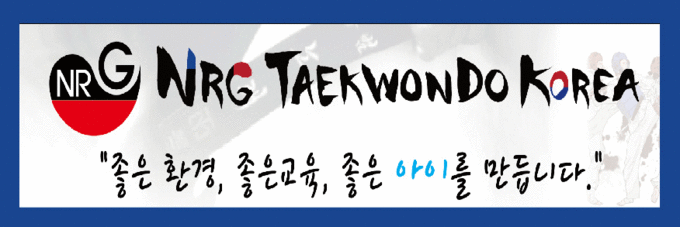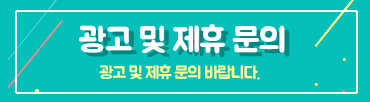- 백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거류민단장(재무부장 겸직)을 맡고 있던 1931년 1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말이 몹시 서툴러서 대화의 절반은 일본어..
백범 김구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거류민단장(재무부장 겸직)을 맡고 있던 1931년 1월,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말이 몹시 서툴러서 대화의 절반은 일본어로 하고, 행동거지도 일본인과 비슷했습니다. 그런 청년이 “젊은 날 일본으로 건너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독립운동에 뜻을 두게 됐는데 상해에 ‘가정부(假政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가정부’는 임시정부를 폄하해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임시정부 간부들은 이 젊은이를 미심쩍어 했습니다. 백범은 달랐습니다. 청년과 우국담론을 나누며 의기투합했습니다. 그 청년은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지고 순국한 ‘철혈남아’ 이봉창 의사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29일자 A25면 톱기사 <고문·굶주림에 흔들렸던 백범, 위대한 투사도 보통사람이었다>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백범은 결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나이, 지역, 출신 성분도 따지지 않았다.” 그런 백범에게 이봉창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찾아 들었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며 독립을 준비하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백범은 ‘달팽이 등껍질처럼 달라붙은’ 사람들을 건사하면서도 한 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품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백범의 목숨을 지켜준 ‘묘약’이 됐습니다. “임시정부는 월세도 못 낼 만큼 가난에 쪼들렸지만 백범의 몸엔 6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현상금이 붙었다. 임시정부 청사 임대료 1600년치를 내고도 남을 돈이었다. ‘움직이는 복권’ 신세가 된 백범을 고발한 한인은 없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백범만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며 치열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백범의 일생 중에서도, 명성황후 시해를 복수하기 위해 일본군 장교를 살해한 죄로 사형집행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과정은 매우 극적입니다. 당시 법정은 일본과의 관계를 의식해 백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죄명을 ‘국모보수(國母報讐: 국모의 원수를 갚음)’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사형집행을 앞두고 승지가 죄명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서 임금께 보여드렸고, 회의 끝에 사형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그런 결정이 백범을 가뒀던 인천감옥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형집행을 사흘 앞두고 서울~인천 간에 개설된 전화를 통해 임금의 지시가 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승지가 사형수 명부를 보지 않았더라면, 전화 개통이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김구는 스물한 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애국 열정, 순수한 정의감으로 엄혹했던 시절을 헤쳐 나갔던 백범에게 일본이 미국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다는 소식은 복음이 아니라 비보였습니다. 완전한 자주독립이 아니었기에 외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게 됐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고 일지에 쓴 백범의 회한을 풀어드리는 일은 후손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이학영 올림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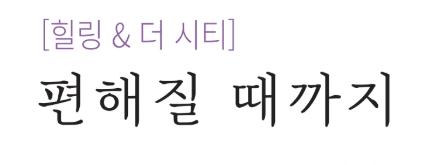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