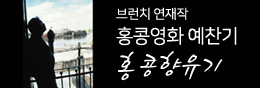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 [제187호, 8월24일]
어처구니없는 기차
그 험한 이집트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여행을 한 나지만 이런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제187호, 8월24일]
어처구니없는 기차
그 험한 이집트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여행을 한 나지만 이런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따라온 가이드에게 어떻게 이런 기차를 우리더러 타라고 하느냐며 따졌더니 이게 뭐 어떻냐는 반응이다. 돈을 더 줄 테니 우리를 좀 이 돼지우리 같은데서 부디 꺼내달라고 사정까지 해봤지만, 자리가 없을 거라며, 자기는 다른 칸으로 가봐야 하니까 빨리 자기자리 찾아 들어가라고 성화를 댔다.
하는 수 없이 우리 침대칸을 찾아 들어갔다. 먹다버린 수박과 온갖 쓰기가 창가에 가득 쌓여있었다. 점입가경이라하니 창가에 팔짱을 끼고 떡 앉아있는 여자 안내양에게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하자 나를 위 아래로 훑어 내렸다. 기가 슬쩍 꺾여 쓰레기를 주섬주섬 주어 그럼 이걸 어디에 버리느냐고 그 여자더러 물으니 모른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혀 더 이상 따지고 항의할 기력도 없었다. 쓰레기가 나뒹구는 기차간 바닥은 습기로 끈적거렸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절망스러웠다.
손대기조차 꺼림직 한 창문을 간신히 연 후 환기 좀 시키려했더니 그 여자가 '꽝'하고 창문을 다시 내려버렸다. 일단 일행들의 침대칸이나 제대로 배정 됐는지 살핀 후 따져야지 하며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여자가 사라지고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여자는 안내양도 아닌 승객 중의 한 명으로, 침대칸에 빈 곳이 있으면 누워가려고 숨어들어온 여자였던 듯했다. 그런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떤 여자가 자꾸 잔소리를 하며 귀찮게 구니 별수없이 포기하고 돌아간 듯 했다.
저 까다롭고 기세등등한 할머니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궁리를 하며 할머니들 침대칸으로 슬슬 갔더니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속사포 같은 비난이 쏟아졌다. 내가 6.25 피난을 떠나올 때도 이보단 나았다, 도대체 우리 홍콩교민을 뭘로 봤길래 이런 델 집어 쳐 넣었느냐, 낼 보따리 싸서 간다... 한참을 그렇게 퍼붓던 속사포도 멈추었다. 소주에 안주거리를 한 보따리 안고 온 마리아 할머니가 소주팩을 뜯어 한 잔씩 돌리며 마음 편하게, 즐겁게 가자고 다독여 주셨다.
밤이 늦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가슴에 지녀왔던 오해와 서운함 등을 툴툴 털어내고 우리 침대칸으로 와보니 이런 침대기차 마저 신기하고 재밌다며 웃고 떠들던 아이들도, 이런데서 어떻게 등을 붙이고 자느냐 시던 어머니도 벌써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셨는지 코고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내 자리는 3층이었다. 간신히 온 힘을 다해 기어 올라갔다가 1미터도 채 안 떨어진 내 침대 옆에 누워 코를 푹푹대며 고는 낯선 50대 아저씨의 모습이 심란해 다시 내려와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졸며 깨며 긴긴 밤을 기차와 함께 달렸다.
그렇게 심란했던 밤도 지나 새벽을 맞아 날이 허옇게 밝아왔다. '밤새 안녕'했느냐는 인사가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다. 다들 밤새 안녕해서 이렇게 웃으며 아침을 맞으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도백하에 도착해 밖으로 나가니 우리와 함께 왔던 가이드는 그곳까지 인솔하는 게 자기 임무였다면서 가버렸고, 새로운 가이드가 기차역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가이드가 가는 곳마다 바뀌느냐며 툴툴거리다가, 새로운 가이드가 젊고 예쁜데다 상냥하고 싹싹하기까지 하니 간밤의 피로마저도 싹 풀리는 듯 했다. 게다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싣고 다녔던 똥차도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 앞에 나타난 대형버스 한 대는 쌈박하기 그지없었다. 피곤에 절은 일행들 얼굴에 그나마 환한 미소가 번졌다.
 백두산이냐 장백산이냐
백두산이냐 장백산이냐
아침 일찍 백두산 초입에 있는 한식당에 들러 아침을 먹은 후 설레는 가슴을 안고 백두산을 향해 달렸다. 30여분 후 도착한 곳은 백두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끊는 곳이었다. 가이드가 티켓을 사러 잠시 사라진 동안 매표소 여기저기를 기웃거려보니 티켓 값이 눈에 들어왔다. 중국인에게는 15위안을, 외국인에게는 150위안을 받고 있었다. 무려 10배 차이다. 오늘도 관광버스가 수없이 몰려드는데, 모두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우리 民族의 靈山을 보기위해 그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한국인들을 상대로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어 보겠다는 심사다. 가슴속에서 '이런 뗏놈들'하며 버럭 욕이 품어져 나왔다.
백두산(白頭山)은 원래 산꼭대기가 흰 눈에 덮여 하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長白山)이라고 부른다. 백두산의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않아 그렇게 불리게 됐다고 한다.

입장권을 끊고 우리를 태운 셔틀버스가 아름드리 미인송과 자작나무 숲이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백두산 영봉(靈峰)을 향하여 서서히 달리는 듯하다 우리를 지프차 타는 곳에 내려놓았다. 공원관리소 측에서 운행하는 지프차를 타고 천문봉 바로 아래 기상대까지 올라가야 한단다.
<글 : 로사 / 계속...>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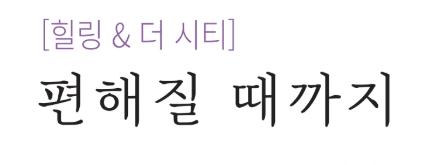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





 입장권을 끊고 우리를 태운 셔틀버스가 아름드리 미인송과 자작나무 숲이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백두산 영봉(靈峰)을 향하여 서서히 달리는 듯하다 우리를 지프차 타는 곳에 내려놓았다. 공원관리소 측에서 운행하는 지프차를 타고 천문봉 바로 아래 기상대까지 올라가야 한단다.
입장권을 끊고 우리를 태운 셔틀버스가 아름드리 미인송과 자작나무 숲이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백두산 영봉(靈峰)을 향하여 서서히 달리는 듯하다 우리를 지프차 타는 곳에 내려놓았다. 공원관리소 측에서 운행하는 지프차를 타고 천문봉 바로 아래 기상대까지 올라가야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