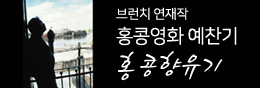- [제210호, 2월 22일]
홍콩생활에 닻을 내리다…
오리엔테이션
2007년 8월,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기대 반 걱정 반으..
[제210호, 2월 22일]
홍콩생활에 닻을 내리다…
오리엔테이션
2007년 8월,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홍콩에 왔다. 우리나라에서 학교나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한 경우들을 익히 봐왔던 지라 오기 전부터 걱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친구는 어떻게 사귀지?', '차별을 당하진 않을까?' 예로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 하지 않았던가. 이 모든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9월 2일. 오전 9시, 대강당에 모여 팀을 배정받았다. 흰색, 분홍, 노랑, 녹색 등등 다양한 색으로 팀이 나뉘어 졌으며 모든 팀원은 2박 3일 내내 각 팀의 색에 맞추어 준비된 티셔츠를 입도록 규정하였다.
홍콩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의 이름을 외우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다.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한 가지 놀랐던 점은 각 팀들이 다양한 학과로 구성 되었다는 점이다.
분홍 팀이었던 나는 우리 조원들 역시 당연히 언론홍보학과이겠거니 생각했거늘 아니었다.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이곳은 서로 다른 학과의 학생들을 혼합 구성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토록 하였다. 물론 사전 작업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나와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반대되는 사고를 가진 친구들을 사귄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동아리나 교양 수업이외엔 나와 다른 학과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 사귐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2박 3일 동안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신계지 통청에서도 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간 바닷가 근처였다. 이곳이 한국의 대성리와 같은 대학가들의 MT촌이라 한다. 이미 몇 몇의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첫 프로그램은 유년시절 운동회 때 했던 서로의 다리를 묶고 이동하는 게임과 유사하였다. 각 팀별로 종이 자동차를 만들어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협동심을 요구하는 게임이었다.
설계, 도안에서부터 마무리,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참여가 부족하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용납되지 않았다. 꾀를 부리는 이도 투정을 부리는 이도 없었다.
처음 게임을 할 당시엔 군소리 없이 게임에 임하는 그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참여해왔던 한국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은 음주가무를 바탕으로 즐기고 노는 것인데 이곳의 프로그램들은 놀이보다는 학습, 연구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스런 게임을 하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는 이 조차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다소 낯선 내게는 게임을 즐기며 적극 참여하는 홍콩의 친구들이 이상하게만 보였다. 나중엔 심지어 '아직 서로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상 재밌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그들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문화였다.
Slogan show, camping game, water war game, life game 등등. 식사 시간을 포함한 모든 활동은 조별 생활이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이가 내 몫까지 해야 했으며 심지어 camping game의 경우엔 조원 하나가 실수를 하게 되면 팀 전원이 다시 해야 하는 규칙을 갖고 있었다. 운동신경이 없는 나로서는 게임을 하는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 게임은 많은 줄이 연결되어 있는 일정공간에 모든 팀원들이 눈을 감고 기차로 만들어 팀장의 지시대로 줄을 하나씩 넘어가는 마치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게임이었다. 하지만 긴장을 하다 보니 더욱 더 실수를 하게 되었고 우리 팀원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너무 많이 주게 되었다. 처음엔 웃으며 애교로 넘겼지만 세 번, 네 번 회를 거듭하자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우리 조원에게 미안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만연한 한국사회와 달리 그들은 '나 하나 까지도 보탬이 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했으며 이를 실생활에서 익히고 실행하는 듯 했다. 심지어 이런 게임에서까지 말이다. 나는 그들에게 '협동정신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내가 한국에 있었어도 이렇게 즐겁게 게임에 임할 수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no'일 것이다. 물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문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왜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없었을까, 음주가무가 없다면 왜 놀이로 생각하지 않을까, 왜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접하며 자라온 이들이지만 2박 3일 동안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물론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에 가능했지만, 모든 활동을 몸으로 한 만큼 우리는 서로의 땀과 체온으로 돈독해 질 수 있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2박3일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게임 내내 다른 사고와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그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놀래 켰다. 서로의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정말 장·단점을 콕콕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질책을 받은 이도, 두뇌게임에서 활약이 돋보였다는 찬사를 받은 이도 있었다. 2박 3일간 그들과 함께 해보니 어떤 평가에도 절대 악의가 담긴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앞에서 직접 장·단점을 평가하는 모습이 내게는 여간 낯설었다. 나 역시 칭찬과 질책을 동시에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뿔이 생기지 않고 이마저도 고맙고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그때부터 이미 홍콩 사람들의 매력에 푹 빠졌던 모양이다.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은 그렇게 끝이 났고, 분홍 팀이었던 우리 멤버들과는 지금도 한 달에 한번 씩 모임을 갖는다. 만날 때마다 낯선 행동으로 나를 놀래키지만 항상 편하고 따뜻하게 대해준, 소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들이 여간 고마운게 아니다.
* 필자는 한국 단국대학교 언론홍보학과 4학년으로 2007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자매학교인 홍콩주해대학교에서 공부중이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모닝 하이라이트] 2025년 05월 01일 (목)
▣ 홍콩-UAE 세관 협력 강화, 무역 효율화 추진▣ LCSD: 3년 내 반려동물 친화 공원 20곳 추가 확충▣ 노동절 골든위크 앞두고 中 관광객 사이공 등산로로 몰려▣ 완차이에서 곤돌라 기울어져 작업자 2명 20층 높이에 고립, 소방대 구조◆ KEB 하나은행 채용 공고, https://www.weeklyhk.com/news/view.php?idx=28208▣ 감사국: 의무적 창문 안전 점검 11,410건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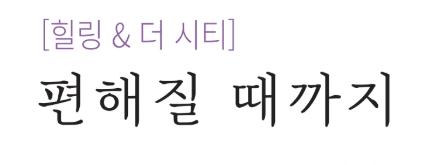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칼럼 [힐링 & 더 시티] 편해질 때까지
말콤 글래드웰 (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Outliers)에서, 적절한 환경에서 1만 시간을 원하는 일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1만 시간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익숙한 ‘작심삼일’에 비하면 1만 시간이란 엄두가 안 나는 길이의 시간입니다.새해가 되어 들뜬 분위기가 무르익은 김에 생각해둔 목표 ...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 2025 어버이날 기념행사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홍콩한인회, 홍콩한인교수협의회 공동] 차세대를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1015호] 2024년 12월 27일
[1015호] 2024년 12월 27일

 목록
목록